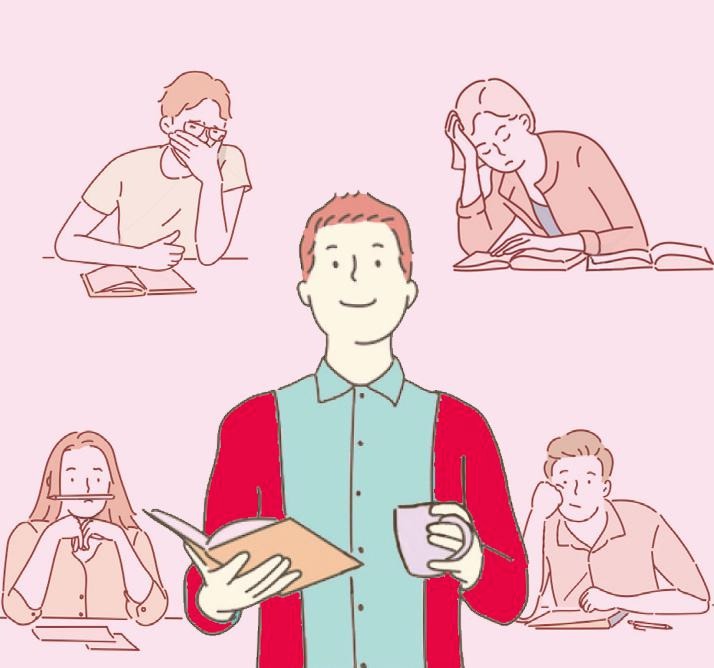관악지부에 외근나갔다가 너무 감명깊에 읽은 탓에 약속시간에 늦었던 문제의 동아일보기사이다. 참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이다.

어려운 가정 환경 탓에 대학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던 검찰 말단 여직원이 15년 만에 예비 사법연수원생으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 정영미 씨는 2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힘든 시련이 있어도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변영욱 기자) |
“15년전 검사님과 법조인 되겠다던 약속 지켰죠”
“검사님처럼 훌륭한 법조인이 돼 돌아올게요.”
1993년 검찰 말단 여직원이 한 초임 검사에게 한 약속을 15년 만에 지켜 화제다.
주인공은 올해 사법시험 3차 면접을 마치고 25일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정영미(35·여) 씨.
정 씨는 1989년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인문계 고교를 포기하고 서울 강북구 신경여상을 1등으로 입학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그는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어 대학을 포기하고 10급 검찰 공무원 시험을 봤다.
1993년 서울지검 형사2부에 배치된 그는 자신의 꿈을 바꿔 놓은 한 검사를 만났다. 그해 초임 검사로 부임한 양부남(현재 광주지검 부장검사) 검사.
당시 양 검사는 한 달에 300건이 넘는 사건을 맡아 야근을 밥 먹듯 반복했다. 정 씨는 공소장을 일일이 타자기로 옮기는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 한 건이 경찰로부터 넘어 왔다. 양 검사는 기록을 살피더니 “뭔가 냄새가 난다”며 경찰을 불러들였다. 조사 결과 경찰이 뇌물을 받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기록을 바꿔 꾸민 것. 양 검사는 전모를 밝혀냈고 그 경찰은 징계를 받았다.
“양 검사님은 매일 야근하면서도 사소한 사건 하나도 자기 일처럼 꼼꼼히 살폈어요. 어느 날은 폭력 사건으로 고아인 소년범이 조사를 받았는데 삼촌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며 최대한 선처를 해주더라고요. 검사의 재량으로 한 소년을 살린 거죠.”
▲동아일보 사진부 변영욱 기자
이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꾸게 된 정 씨는 2년 동안 일한 검찰을 떠났다.
생활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낮에는 음식점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대학입시 학원을 다녔다. 2년 뒤인 1996년 숭실대에 입학했지만 아버지 병세가 악화돼 보험회사 상담원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래도 꿈은 포기할 수 없었다. 2001년 독한 마음을 먹고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갔다. 흔한 학원조차 갈 여유가 없어 강의 테이프를 들으며 주경야독한 지 7년. 올해 드디어 2차 사법시험에 붙었다.
월급 타면 어머니 치아를 가장 먼저 해주고 싶다는 그는 2차 합격 후 가장 먼저 양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검사님이 아직도 제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올해 합격이 안 되면 내년에 또 할 생각이었습니다. 꿈과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등하니까요.”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