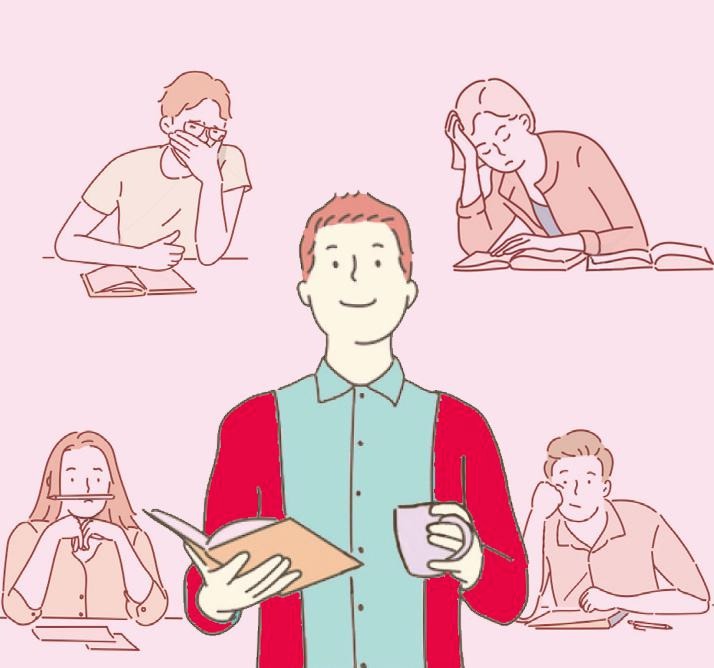-
반응형

신화가 된 만화가, 이현세 - 
이현세 지음/예문
이현세작가를 만나서 그동안 하고싶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마디 불평없이 손수 싸인을 해주시던 그분의 모습에 감사하고 항상 대한민국 문화컨텐츠산업의 선구자로 남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걷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죽으면 못 걷잖아요. 살아 있을 때 많이 걸어야죠.”
개나리가 쫑긋쫑긋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3월말 어느 아침, 만화가 이현세(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씨는 함께 걸을 20명을 만나자 “오늘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며 걸어보자”고 제안했다. “먹고 살 걱정 잠시 접으시고, 즐겁게요.”![NV1S2088[20090408180404].jpg](http://bbs.chosun.com/file/upimages/2006153220/1/NV1S2088%5B20090408180404%5D.jpg)
이날 걸은 길은 서울 남동쪽에 숨어 있는 봄꽃 천지, 응봉공원길이다.
군자역에서 출발해 개나리 벚꽃으로 가득한 송정동 둑길을 지나 ‘개나리산’이라 불리는 응봉산을 거쳐 서울 숲까지 이어진다.
어머니가 17년 동안 만화방을 한 덕분에 이현세씨 만화와 함께 성장한 30대 남성, 하얗게 변한 아빠 머리 보며 늦은 나이 여태 미혼인 게 미안해 아빠 손 꼭 잡고 왔다는 딸, 이현세씨 만화 보고 그림 연습 열심히 한 중학생 아들과 그 아빠. 이씨와 함께 걸으며 물을 것 많은 듯한 20명의 얼굴은 따스한 봄볕 덕분인지 한껏 들떠 보였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공포의 외인구단’이 나왔어요.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너희 집 만홧가게라며?’하면서 관심을 보이시는 거에요. 만화 본다고 친구들이 벌 받고 그런 시절이라, 저희 집 만홧가게 하는 게 무지 창피했거든요. 외인구단 덕분에 부끄러움을 극복했어요.” (즐거운 나만의 추억^^)
어른들의 ‘소재’는 단연 어린 시절 기억 속 남아있는 이씨의 만화, 그중에서도 ‘만화의 전설’로 일컬어지는 ‘공포의 외인구단’이었다. 이씨는 “그때까지 만화는 애들이나 보는 책으로 여겨졌다. 온 가족이 만화를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작정하고 그린 게 ‘공포의 외인구단’”이라고 했다. “지금 드라마로 만들고 있는데 20년 넘은 만화라 손 볼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어 만화에서 여주인공 ‘엄지’가 무직(無職)이거든요. 그땐 학교 졸업하면 시집간다고 생각했으니까. 요즘 드라마에 그런 주인공 나오면 무지 어색하겠죠.”
‘외톨이’ ‘남벌’ ‘아마게돈’ ‘고교외인부대’‘만화의 추억’을 나누는 사이 길은 쭉 뻗은 송정동 둑길을 지나 응봉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만홧가게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저마다 이씨의 만화를 애독했다던 이들의 ‘입담’에 이씨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있었네요”라며 즐거워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작가님 만화가 있어서 저희가 있는 거죠.”
나이 지긋한 참가자들은 이씨의 ‘롱런’ 비결이 궁금한 모양이었다.
30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친 팬을 확보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씨는 “끊임없는 리모델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씨의 ‘리모델링’은 4년 전쯤 시작됐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로 ‘이현세’를 꼽는데도, 어린이들이 이씨 만화의 남녀 주인공 ‘까치’와 ‘엄지’를 모른다는 게 충격이었다.
“사인회를 하면 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서 와요. 그러면서 ‘나루토 그려주세요’ ‘드래곤볼 그려주세요’ 그래요. ‘그런 건 못 그려. 까치 그려줄게’ 하니까 화내고 가는 거에요, 글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치열한 고민 끝에, 이제는 학부모가 된 옛 지지층과 자라나는 어린이 독자를 동시에 공략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게 만화 ‘한국사’다. “많이 팔리냐고요? 요즘은 그것 때문에 먹고 산다고만 해두죠, 하하.”
응봉산 정상, 햇빛에 반짝이는 개나리 동산 아래로 중랑천과 한강이 합쳐지며 봄 풍경에 생동감을 더했다.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닿는 법이죠. 그런데 그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삶은 장거리니까. 중요한 건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열정이 사라지면 꿈도 없어지고, 그러면 모든 게 시시해지고 말죠. 결국 해지기 전 ‘한 걸음’ 더 걷는 방법밖에 없어요. 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히말라야를 넘은, 아흔 넘은 노승(老僧)에게 사람들이 ‘나폴레옹도 못 넘은 이 높은 산을 어떻게 넘었냐’고 물으니 그랬다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넘었다고.”
동영상보기 http://businesstv.chosun.com/broad/BroadMain.do?param=popSee&pgmCode=I0022&epsCode=9I017560
글=김신영 기자 sky@chosun.com 사진=조선영상미디어 이경호 기자 ho@chosun.com
728x90'마음대로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부잘하는 돌연변이 X맨 (0) 2009.05.03 성공은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이해심과 할아버지의 재력이 이룬다. (0) 2009.04.22 머릿속 상상을 표현하는 즐거운 기분 (0) 2009.04.15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으로 만들어진다. (0) 2009.04.13 공부에 목숨건 거지와 공부가 가장 쉬웠던 부자 (0) 2009.04.06 댓글